21.03.12
흰머리가 많이 난다.
아, 그렇다고 무지막지하게 흰머리만 있는 건 아니고, 새치가 드문드문 보이는 것이다.
특히 고등학생 때 정말 많이 들었다. 가만히 앉아있다 보면, 친구든 누구든 와서
"흰머리 뽑아줄까?"
라는 말을 하고는 했다. 이런 말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는 뭐 흔쾌히 그러라고 하기도 하고는 했다. 흰머리를 뽑을 때면 뭔가 쾌감도 있었고, 뽑힌 흰머리를 보면 뭔가 낚싯줄 같기도 한 게 참 신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어느순간부터는 흰머리를 뽑는 걸 피하게 되었다.
딱히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다. 어느 순간부터 흰머리가 드문드문 보이는 것이 조금 지적인 것처럼 보였기에, 나도 지적으로 보이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지적인 이미지와 크게 연관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지만 말이다.
굳이 가만히 있는 흰머리를 뽑는다고 다른사람이 내 머리를 훑는 것도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았고, 흰머리 좀 두는 게 어떤가 싶기도 하고, '흰머리가 보이면 무조건 뽑아야 한다!'라는 선입견? 같은 것에 맞서는 느낌도 없잖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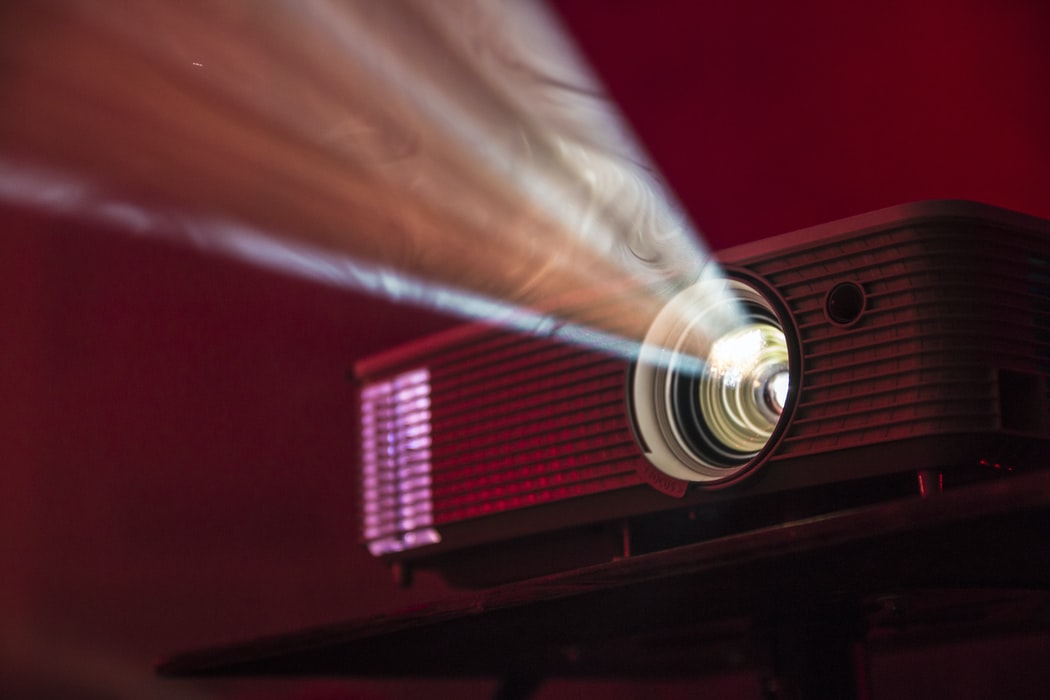
그렇다. 차라리 그런 반항적인 느낌이 좀 더 강했다. 모두에게 당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사실이 너무 싫었다. 그것이 정말로 옳은 길이라도, 다수의 사람들이 당연스럽게 찬동하고있노라면 괜히 싫증 나고 의문을 갖고 대항하고 싶고 그런 것이다. 반드시 내 기준으로, 내가 생각했을 때에 어느 정도 합리적이고 합당한 무언가가 있어야 비로소 받아들이고는 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경계하고, 아무 생각 없이 찬동하는 이들을 비웃어보기도 했다.
생각이 너무 많았던 걸지도 모르겠다. 생각을 너무 꼬아서 해왔는지도 모르겠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있고, 지금은 많이 적응되고 숙달되어서 생각이 여러 알고리즘을 거치는데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었다. 사회생활하다 보니 눈치도 늘어서, 주변 사람들 하는 거 보고 대충 따라 하면서 처세술을 하나하나 익혀보기도 했다. 여전히 낯설고 어색하지만 말이다.
어떤것에 신중해야 하고 어떤 것에 대충 넘어가야 하는지도, 살아가다 보니 뭔가 어긋난 적이 종종 있었다는 걸 느낀다. 이를테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가 마음이 상하거나 남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건 지금까지 대충 넘겨왔었다. 그러면 안된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 쉽지 않은 것이다. 나 자신 혹은 다른 사람 감정을 상대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다.
차라리 내가 아끼는 사람들이 무언가 불합리한 처지에 놓여있거나, 상황이 부당하게 돌아간다 싶을때는 정말 온 집중을 다해서 상황을 더 나은 방향으로 해결하고자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관계적 상호작용은 정말 쉽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말수가 점점 줄어들고, 사람들에게 웃어보이는 표정은 나 자신도 아직도 어색하다. 아직은 나이를 많이 먹지 않아서 그런지, 이런 게 걱정거리나 고민거리는 아니다. 차라리 감사하다. 이런저런 감정에 휘둘리고 그러면 얼마나 지치겠는가 싶기도 하다.
그래도 가끔은 뭔가 안타까울때가 있다. 영화관에서 감성적인 영화를 볼 때나, 화기애애한 파티에 강제로 참가해야 할 때나,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을 때 말이다.



